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개최된 '첨단제약바이오 인허가 워크숍'에서는 최신 인허가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술이전 및 인허가 획득에 성공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실제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성공적인 IND 승인을 위한 비임상 개발전략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강석모 바이오톡스텍 상무는 "비임상 단계에서 CMC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많은 기업이 'CMC는 CDMO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CMC 준비가 안 돼 비임상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한, 세포치료제 등을 개발했지만, CMC 영역을 진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비임상을 진행했다가 식약처나 FDA에서 다시 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저분자화합물보다 바이오로직스가 CMC에 대한 부분이 많이 디벨롭된 상태에서 비임상에 들어올 수 있어야 리스크가 적다"면서 "CMC 차원에서 정량분석법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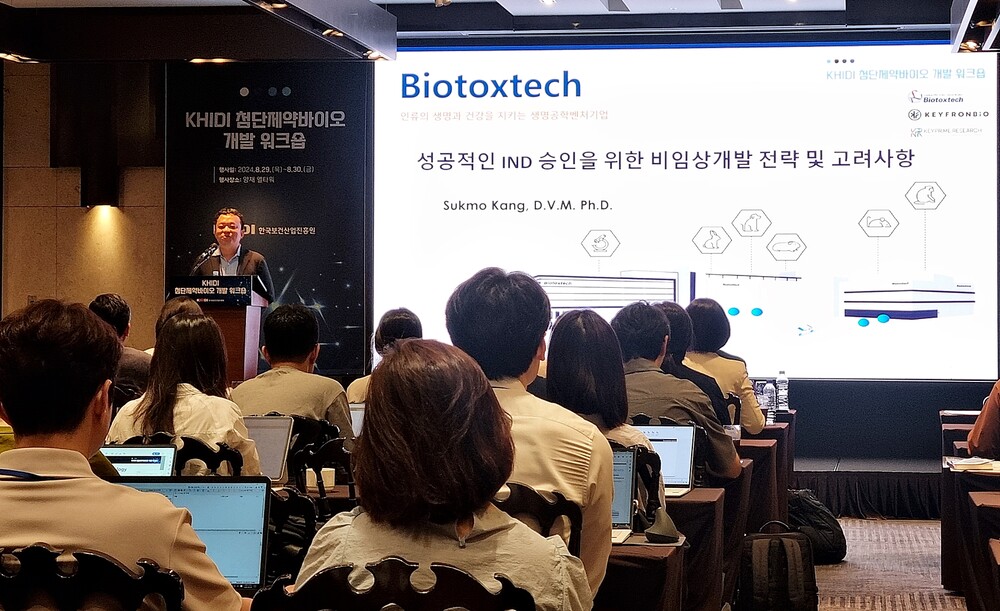
글로벌 제약사외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Human POC가 되었는가 ▲CMC는 검증됐는가 ▲기술이적 Track Record(양산가능성)가 있는가 등과 같은 3가지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초창기에 CMC는 남의 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들은 상업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CMC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기술이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겪었던 일이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중국 포순제약과 기술이전을 앞두고 있었던 때, 최종 사인을 하기 전 포순제약 측에서 CMC 과정의 어려움을 자신들만 감당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계약을 재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리스크의 절반을 함께 안고 가겠다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기술이전 및 파트너십 체결에 성공, CMC 개발 과정을 함께 하면서 관련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CMC 개발의 중요성을 느낀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2017년부터 관련 전문가를 회사에 영입하며 CMC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박현수 팀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FDA IND 승인이 거절되거나 연기된 제품 중 35%는 CMC 이슈 때문이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CMC 이슈로 인해 임상시험 중지가 된 제품은 44%, 지난해 FDA 품목허가 과정에서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신약은 36건, 이 중 CMC 이슈에 의한 것은 18건으로 50%에 달했다.
박 팀장은 "보통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GMP 시설을 찾아 계약을 맺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정이 다급하다보니 GMP를 잘 준수하는 기업인지 체크를 하지 못하고 단가를 싸게 해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약 품목허가 실패 이유 중 50%가 CMC 이슈라는 것을 볼 때 CMC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대조약)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오리지널의 품목허가 과정을 참조해서 동등성이 입증되면 임상은 보통 1상을 하고 3상을 하거나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이때 3상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CMC의 역량이라는 설명이다. CMC에서 품질이 확인이 되면 바로 임상 3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 팀장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CMC는 뒤로 갈수록 요구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진다"면서 "목표하는 연구 개발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필요한 수준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컨설팅을 받기도 하면서 실제 목표하는 CMC의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비용도 줄이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