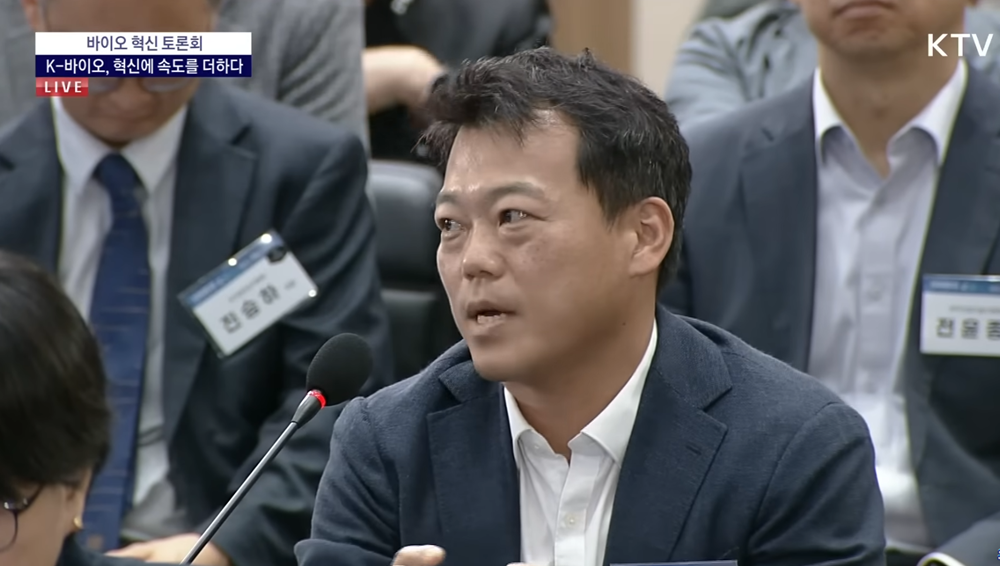
9일 박성률 움틀 대표는 정부 주도 공적 바이오 생산시설 설립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 이유를 두고 메디파나뉴스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2020년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 움틀을 창업했다. 국내 바이오 업계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국산화를 이뤄보자는 포부에서다.
이어 박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산업용 필터인 멤브레인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멤브레인은 크기가 다른 물질을 분리하는 일종의 필터로 바이오의약품 연구와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중 하나다.
그런 그가 지난 5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국내 바이오 기초 산업이 부실하니 국가 주도로 백신 공장 발주를 내 관련 소부장들을 국산 제품들로 채워보자"였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에게 정부가 펀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규제 업무(RA) 노하우나 레퍼런스가 쌓일 거란 주장이다.
현재 국내 CDMO 기업이나 바이오텍이 사용 중인 국산 바이오 소부장 제품 비율은 5%에 그치기 때문이다. 5%란 수치도 비핵심 분야만 따졌을 때다. 핵심 공정으로 들어가면 더욱 처참해진다. 국산화 비율은 0%기 때문이다.
즉, 바이오 기초 산업인 원부자재들은 사실상 외국 기업에게만 의존하는 셈이다. 이에 국내 바이오 소부장 업체들에게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부 주도 바이오 생산시설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전부 참여시킨다면, 업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레퍼런스 부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표는 "여기에 공장을 2기, 3기까지 늘려준다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레퍼런스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부장에 국가 R&D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업에 대기업까지 참여시킬 수 있으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바이오 생산시설 발주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기업이 따내는 식이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구축부터 운영까지 들어가는 원부자재에 대한 자립화 방안을 세우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이에 맞춰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바이오 기초 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은 강화되고, 국내 CDMO·바이오텍들도 외국 기업들과 원부자재 계약에서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국산 소부장 업체로 다 대체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급 점유율을 높인다면, 글로벌 소부장 기업인 싸토리우스나 싸이티바, 밀리포어 입장에선 가격을 안 낮추고는 못 배길 것"이라며 "반도체에서 ASML을 이른바 '슈퍼 을'이라고 하잖나. ASML이 장비를 안 주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