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허가는 약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무에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제도와 의약품 품목 허가 과정을 개관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는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연구에 의하면 특허 만료 이후 약가는 70~80% 이상 폭락한다. 따라서 제약산업에서 특허권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특허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이 제도는 특허와 의약품 품목허가를 연결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제네릭의 적법한 진입을 촉진하는 장치다.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① 특허 등재 : 오리지널사가 품목허가 신청 시 관련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할 수 있다. 제네릭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이들 특허가 고려 대상이 된다.
② 통지제도 및 판매 금지 : 제네릭 개발사는 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리지널사는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우선판매품목허가 : 최초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네릭사는 9개월 간 단독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제네릭 개발을 독려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3.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존속기간 및 연장까지
특허가 등록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출원(Filing) :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
② 심사 및 등록결정 : 출원 후 심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유효한 특허로 판단되면 등록하게 된다.
③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의약품 특허의 경우 '허가 지연 기간'을 반영해 최대 5년간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의약품 특허는 통상 개발 초기,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전후로 출원된다. 등록된 특허에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다.
4. 의약품 품목허가 : 임상시험 1상부터 3상까지
일반 공산품은 자유롭게 제조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제약산업에서는 임상시험 1~3상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즉, 의약품 시장에서는 '허가'라는 강력한 허들(Hurdle)이 존재하는 것이다.
5. 특허와 허가가 연계되는 모습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타겟 물질'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이후 임상을 거쳐 허가까지 받게 된다. 이 두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된다.
특허는 보호 수단, 허가는 시장 진입 수단이다. 아무리 훌륭한 특허가 있어도 허가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고, 반대로 허가가 있어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독점권이 없거나 특허가 만료됐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오리지널사가 제품을 출시한 후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때에도 허가-특허는 연계된다.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분석해 회피전략(무효 주장 또는 비침해)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회피가 가능하다고 보면 제네릭사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허특제도(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사는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이때 오리지널사가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공격하는 제도도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는 특허 회피를 장려하는 유인책이다. 제네릭사가 성공적으로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독점 판매권을 얻는 혜택을 받게 된다.
6. 맺음말
신약 개발 또는 제네릭 약품 개발의 성패는 '특허 전략을 어떻게 짜서 신약 개발 비용을 회수할 것인가', '허가 시점에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라면 단순한 허가 과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특허 전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글을 마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이일형 변호사
----------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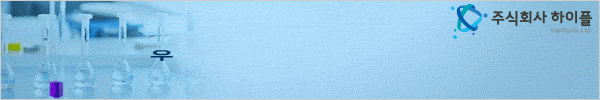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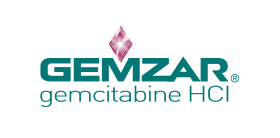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