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기고] 건보급여 제한 교통사고 중대과실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공단부담금이 약 10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부당한 지급으로 보고,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코스피 의약품업종 시총, 3Q 6.4조↑…'셀트리온' 등 상승 견인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올해 3분기 코스피(KOSPI)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종 47곳의 시가총액이 전 분기 말 대비 6조482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대형주의 시총 확대가 전체 시가총액 증가를 주도했으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일동제약이 164%로 가장 높았다. 2일 메디파나뉴스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바탕으로 코스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종 47개사의 올해 3분기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7월 1일 기준 139조8826억원에서 9월 30일 기준 146조3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이 3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10.1)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강북삼성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2일 오후 5시 20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 연휴 시기에 현장의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
-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22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간을 뛰어넘는 기술,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2025 대한약학회 추계
-
마퇴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와 MOU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와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소장 정기출)은 지난 2일 중독자 사회재활지원 및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도 내 중독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협력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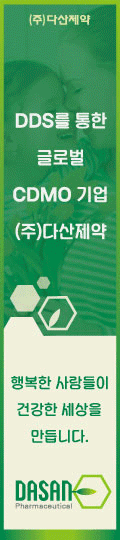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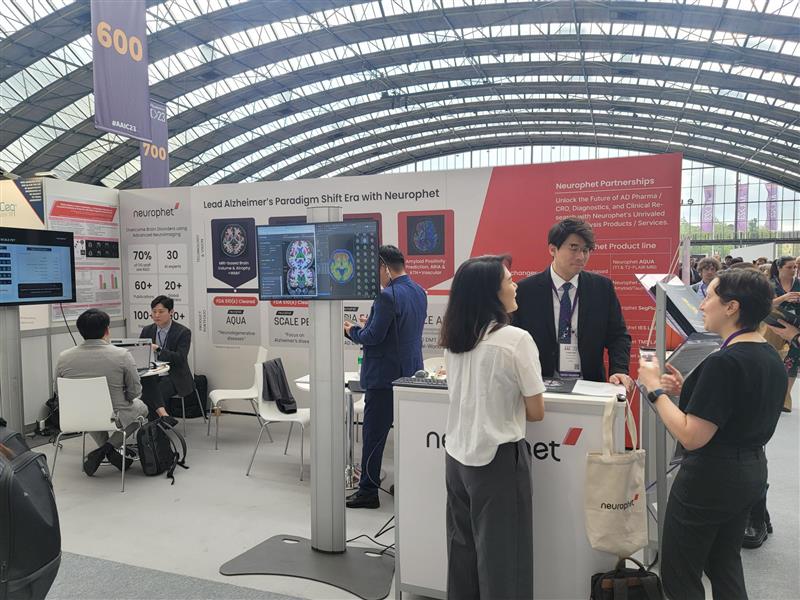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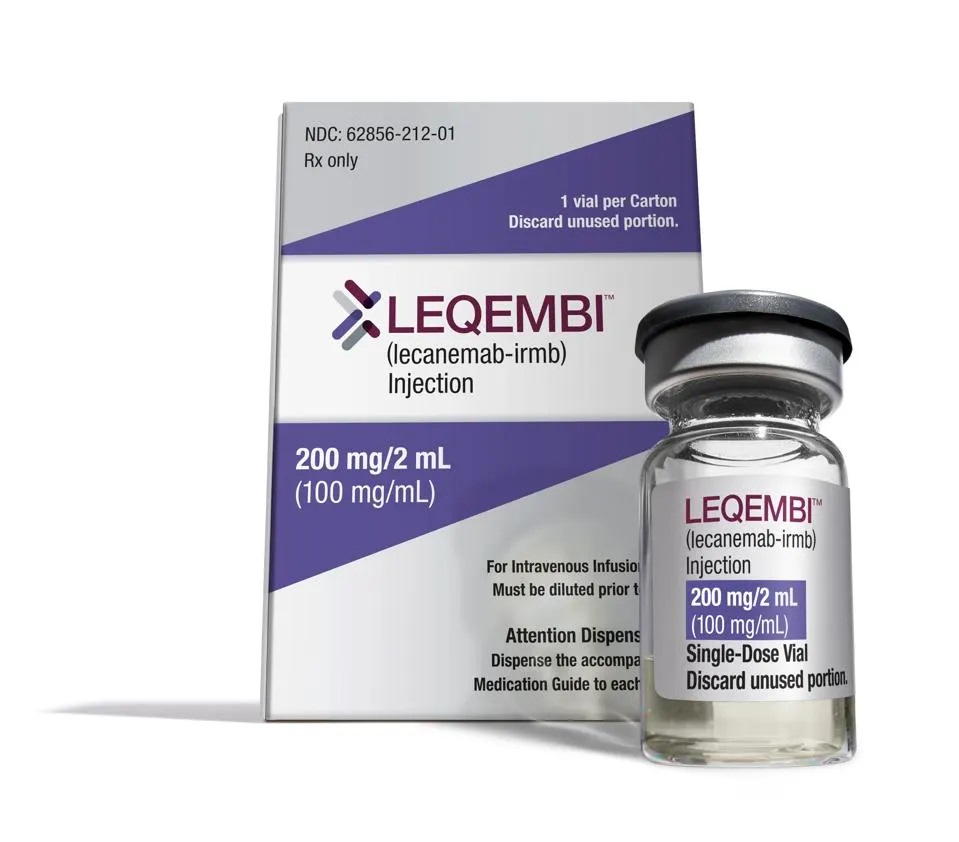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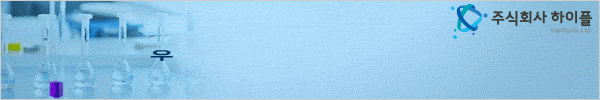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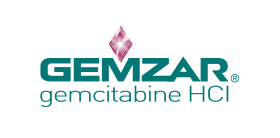


![[포토] 돌잔치보다 기부, 충북대병원에 첫돌 기념 선행](/upload/editor/20250926100825_8B118.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