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ЭілЯ∞ кЄ∞мВђ
мЦілХМмЪФ?
мЛ§мЛЬк∞Д
лє†л•ЄлЙімК§
лЛ§мВ∞м†ЬмХљ, 'м≤≠мЖМлЕД к±ік∞Х мЮРкЄ∞лПДм†Д м±Мл¶∞мІА' нЫДмЫР
лЛ§мВ∞м†ЬмХљ(лМАнСЬмЭімВђ л•ШнШХмД†)мЭА к≤љкЄ∞лПДк≥†мЦСкµРмЬ°мІАмЫРм≤≠ 2025 м≤≠мЖМлЕДлђЄнЩФмґХм†Ь к≥µлПЩ м£ЉкіАмВђмЭЄ нХЬкµ≠м≤≠мЖМлЕДлПЩмХДл¶ђмЧ∞лІє(мЭімВђмЮ• л•ШнШХмД†)мЭШ 'м≤≠мЖМлЕД к±ік∞Х мЮРкЄ∞лПДм†Д м±Мл¶∞мІА'мЧР нШС놕 нЫДмЫРмВђл°Ь м∞ЄмЧђнХЬлЛ§к≥† 20мЭЉ л∞ЭнШФлЛ§. 'м≤≠мЖМлЕД к±ік∞Х мЮРкЄ∞лПДм†Д м±Мл¶∞мІА'лКФ м≤≠мЖМлЕДлУ§мЭі мХљлђЉ мШ§лВ®мЪ© л∞П лєДлІМ лУ± мЛђк∞БнХЬ м≤≠мЖМлЕДкЄ∞мЭШ м†ХмЛ†м†Б, мЛђл¶ђм†Б мД±мЮ• л∞©нХі мЪФмЭЄмЧРмДЬ л≤ЧмЦілВШ м≤≠мЖМлЕД мК§мК§л°Ь лПДм†ДнХШлКФ мВґк≥Љ мЧ≠лЯЙмЭД к∞ХнЩФнХШк≥†мЮР нХШлКФ л™©м†БмЭілЛ§. нЫДмЫРкЄИмЭА 30мЧђк∞Ь лПЩмХДл¶ђ мІАмЫРкЄИмЧР мВђмЪ©лРШл©∞ мЧ∞лІР мЛЬмГБмЮРмЧРк≤МлКФ мГБкЄИмЭі мИШмЧђлРЬлЛ§. мЭімЧР лЛ§мВ∞м†ЬмХљмЭА м≤≠мЖМлЕДлУ§мЭі л∞Фл•Є м†ХмЛ†к≥Љ к±ік∞ХнХЬ мЛ†м≤іл•Љ к∞Ц촧мЬЉл°ЬмН® м†Х
лПЩмХДST, 'м†Ь60нЪМ л∞Ьл™ЕмЭШ лВ†' лМАнЖµл†є нСЬм∞љ мИШмГБ
лПЩмХДмЧРмК§нЛ∞(лМАнСЬмЭімВђ мВђмЮ• м†ХмЮђнЫИ)лКФ мІАлВЬ 19мЭЉ мДЬмЪЄ к∞ХмДЬкµђ мљФмЧСмК§ лІИк≥°мЧРмДЬ к∞ЬмµЬлРЬ 'м†Ь60нЪМ л∞Ьл™ЕмЭШ лВ†' кЄ∞лЕРмЛЭмЧРмДЬ лМАнЖµл†є нСЬм∞љмЭД мИШмГБнЦИлЛ§к≥† 20мЭЉ л∞ЭнШФлЛ§. л∞Ьл™ЕмЭШ лВ†мЭА мДЄк≥Д мµЬміИл°Ь мЄ°мЪ∞кЄ∞л•Љ л∞Ьл™ЕнХЬ лВ†мЭЄ 1441лЕД 5мЫФ 19мЭЉмЭД кЄ∞лЕРнХШкЄ∞ мЬДнХі 1957лЕД кµ≠к∞АкЄ∞лЕРмЭЉл°Ь мІАм†ХлРШмЧИмЬЉл©∞ лІ§лЕД лґДмХЉл≥Д л∞Ьл™ЕмЬ†к≥µмЮРмЩА мЫРм≤Ь·нХµмЛђкЄ∞мИ† лУ±мЭД к∞Ьл∞ЬнХЬ к∞ЬмЭЄк≥Љ лЛ®м≤іл•Љ л∞ЬкµінХі нПђмГБнХШк≥† мЮИлЛ§. лПЩмХДмЧРмК§нЛ∞лКФ м†БкЈєм†БмЭік≥† мІАмЖНм†БмЭЄ R&D нИђмЮРл•Љ нЖµнХі л∞Ьл™ЕмЭД міЙмІДнХШк≥† лЛ§мИШмЭШ мЧ∞кµђ мД±к≥Љл•Љ лПДмґЬнХШмЧђ нХЬкµ≠нШХ кЄАл°Ьл≤М мЭШмХљнТИ мЦСмД±мЧР кЄ∞мЧђнХЬ к≥µл°Ьл•Љ мЭЄм†Хл∞ЫмХД
м†АнХ≠мД± к≥†нШИмХХ нЩШмЮРмЧРмДЬ мХДл∞Ал°ЬлЭЉмЭілУЬ мєШл£М нЪ®к≥Љ нЩХмЭЄ
3к∞Ь мЭімГБмЭШ нХ≠к≥†нШИмХХм†Ьл•Љ мВђмЪ©нХШлКФ м†АнХ≠мД± к≥†нШИмХХ нЩШмЮРмЧРмДЬ 4л≤ИмІЄ мХљм†Ьл°Ь мВђмЪ©нХ† мИШ мЮИлКФ мХљлђЉмЭШ мєШл£М нЪ®к≥Љк∞А нЩХмЭЄлРРлЛ§. мЧ∞мДЄлМА мДЄлЄМлЮАмК§л≥СмЫР мЛђмЮ•лВік≥Љ л∞ХмД±нХШ·мЭім∞ђм£Љ кµРмИШмЩА нЖµнХ©лВік≥Љ мЛ†лПЩнШЄ кµРмИШ, мХДмВ∞л≥СмЫР мЛђмЮ•лВік≥Љ кєАлМАнЭђ кµРмИШ, лґАм≤ЬмД±л™®л≥СмЫР мИЬнЩШкЄ∞лВік≥Љ мЮДмГБнШД кµРмИШ, нХЬмЦСлМАнХЩкµРл≥СмЫР мЛђмЮ•лВік≥Љ мЛ†мІДнШЄ кµРмИШ мЧ∞кµђнМАмЭА м†АнХ≠мД± к≥†нШИмХХ нЩШмЮРмЧРмДЬ 4л≤ИмІЄ нХ≠к≥†нШИмХХм†Ьл°Ь мХДл∞Ал°ЬлЭЉмЭілУЬмЭШ мєШл£М нЪ®к≥Љл•Љ нЩХмЭЄнЦИлЛ§к≥† л∞ЭнШФлЛ§. мЭімЧР лФ∞л•іл©і, кЄ∞м°і мєШл£Мм†ЬмЭЄ мК§нФЉл°ЬлЖАлЭљнЖ§к≥Љ лєДкµРнХі нШИмХХ к∞РмЖМ нЪ®к≥Љ, л™©нСЬ нШИмХХ лПДлː땆 лУ±мЧРмДЬ л™®лСР мЧілУ±нХШмІА мХКмЭА к≤ГмЭД нЩХмЭЄнЦИлЛ§.
-
мЧђлУЬл¶Д ¬Ј мГЭл¶ђ лґИмИЬ мЬ†л∞ЬнХШлКФ 'лЛ§лВ≠мД± лВЬмЖМ м¶ЭнЫДкµ∞' мІДлЛ® л∞ЫмХШлЛ§л©і
мЧђмД±мЭА мГЭл¶ђ м£ЉкЄ∞лІИлЛ§ нХШлВШмЭШ лВЬнПђк∞А мХљ 2cmкєМмІА мЮРлЮА нЫД л∞∞лЮАмЭі лРШл©∞ мЮДмЛ†мЭі лРШмІА мХКмХШмЭД к≤љмЪ∞ 2м£Љ нЫДмЧР мЫФк≤љмЭі мЛЬмЮСлРЬлЛ§. лЛ§лВ≠мД± лВЬмЖМ м¶ЭнЫДкµ∞(PCOS)мЭА мЮСмЭА лВЬнПђк∞А лПЩмЛЬмЧР мЧђлЯђ к∞Ь л∞ЬмГЭнХШмІАлІМ нХЬ к∞ЬлПД м†ЬлМАл°Ь мД±мЮ•нХШмІА л™їнХШлКФ мІИнЩШмЭілЛ§. л∞∞лЮАмЭі лРШмІА мХКмЬЉлѓАл°Ь м†ХмГБм†БмЭЄ
-
м†ЬмЭімЧШмЉАмЭі, DWI нЩЬмЪ© кЄЙмД± лЗМк≤љмГЙ к≤АмґЬ мД±лК• к≤Ам¶Э
м†ЬмЭімЧШмЉАмЭі(лМАнСЬ кєАлПЩлѓЉ)лКФ мЮРмВђ мЧ∞кµђмІДмЭі м£ЉлПДнХЬ нЩХмВ∞к∞Хм°∞мШБмГБ(DWI) нЩЬмЪ© кЄЙмД± лЗМк≤љмГЙ к≤АмґЬ мД±лК• к≤Ам¶Э лЕЉлђЄмЭі лД§мЭім≤Ш мЮРлІ§мІА Scientific ReportsмЧР к≤МмЮђлРРлЛ§к≥† 20мЭЉ л∞ЭнШФлЛ§. мЭіл≤И мЧ∞кµђлКФ кµ≠лВі 10к∞Ь лМАнХЩл≥СмЫРмЧРмДЬ мИШмІСнХЬ 1лІМ820к±імЭШ MRI DWI мШБмГБмЭД
-
лЕЄл∞Фл∞±мК§ мљФл°ЬлВШ19 л∞±мЛ† 'лИДл∞±мЖМлєДлУЬ' FDA м†ХмЛЭмКємЭЄ
[л©ФлФФнММлВШ лЙімК§ = мЭім†ХнЭђ кЄ∞мЮР] лЕЄл∞Фл∞±мК§мЭШ мљФл°ЬлВШ19 л∞±мЛ† 'лИДл∞±мЖМлєДлУЬ'(Nuvaxovid)к∞А лѓЄкµ≠ FDAл°ЬлґАнД∞ м†ХмЛЭмКємЭЄмЭД мЈ®лУЭнЦИлЛ§. мЭіл≤И м†ХмЛЭмКємЭЄмЬЉл°Ь лИДл∞±мЖМлєДлУЬлКФ 65мДЄ мЭімГБ мД±мЭЄ, кЈЄл¶ђк≥† 12~64мДЄмЭШ м§См¶ЭнЩФ мЬДнЧШмЭі лЖТмЭА кЄ∞м†АмІИнЩШ нЩШмЮРмЧР нХЬнХі мљФл°ЬлВШ19 мШИл∞©мЧР мВђ
-
лЕЄл≥СлСР лНФнМЬл™∞ лМАнСЬ л™®мєЬмГБ
лЕЄл≥СлСР лНФнМЬл™∞ лМАнСЬ(м†Д кіСлПЩм†ЬмХљ м†Длђі) л™®мєЬ л≥ДмДЄ. вЦ≤лєИмЖМ : кіСм£Љкµ≠лєИмЮ•л°АлђЄнЩФмЫР 403кіА (кіСм£ЉкіСмЧ≠мЛЬ мДЬкµђ нЪМмЮђл°Ь 825) вЦ≤л∞ЬмЭЄ : 2025лЕД 5мЫФ 21мЭЉ(мИШ) 10мЛЬ40лґД вЦ≤мЮ•мІА : л™©нПђмґФл™®к≥µмЫР-нХ®нПЙмД†мШБ
лЛємЛ†мЭі
мЭљмЭАлґДмХЉ
м£ЉмЪФкЄ∞мВђ
 мєімєімШ§м±ДлДРмґФк∞А
мєімєімШ§м±ДлДРмґФ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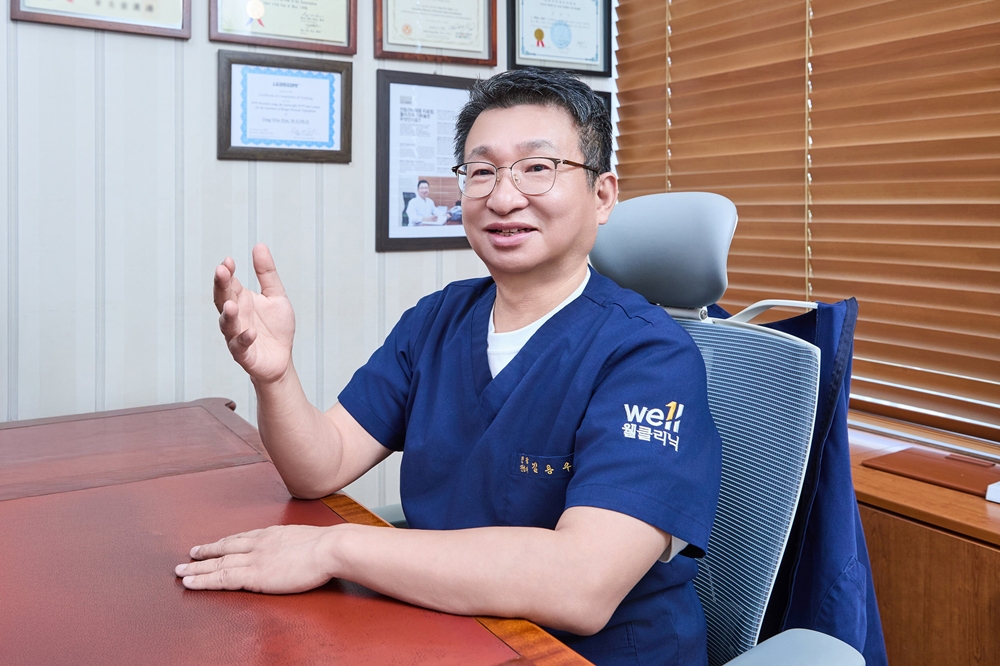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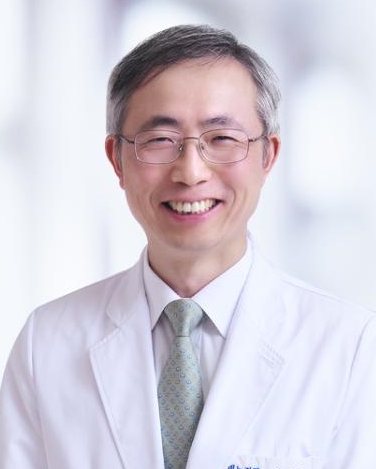









![[нПђнЖ†] нХЬл¶ЉлМАмД±мЛђл≥СмЫР, 'л°ЬліЗ'мЭА мєілД§мЭімЕШмЭД мЛ£к≥†](/upload/editor/20250508140707_308D0.jpg)
![[нПђнЖ†] "мЦіл≤ДмЭілВ† мґХнХШлУЬл¶љлЛИлЛ§. к±ік∞ХнХШмДЄмЪФ"](/upload/editor/20250508140139_F6A3D.jpg)

лПЕмЮРмЭШк≤ђ
мЮСмД±мЮР лєДл∞Ал≤ИнШЄ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