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қҙлҹ° кё°мӮ¬
м–ҙл•Ңмҡ”?
мӢӨмӢңк°„
л№ лҘёлүҙмҠӨ
мқҳлҢҖ мҰқмӣҗ м ңлҸҷ кұёлҰ¬лӮҳвҖҰлІ•мӣҗ "мөңмў… мҠ№мқё л©Ҳ추лқј"
[л©”л””нҢҢлӮҳлүҙмҠӨ = мЎ°нӣ„нҳ„ кё°мһҗ] лІ•мӣҗмқҙ мқҳлҢҖм •мӣҗ мҰқмӣҗм—җ м ңлҸҷмқ„ кұёкі лӮҳм„°лӢӨ. лӮҙлӢ¬ мӨ‘мҲң лІ•мӣҗ кІ°м • м „к№Ңм§Җ мқҳлҢҖ лӘЁм§‘ м •мӣҗ мөңмў… мҠ№мқёмқ„ мӨ‘лӢЁн•ҳлқјлҠ” мҡ”мІӯмқҙлӢӨ. 30мқј м„ңмҡёкі л“ұлІ•мӣҗмқҖ мқҳлҢҖкөҗмҲҳ·м „кіөмқҳ·мқҳлҢҖмғқкіј мқҳлҢҖ 진н•ҷмқ„ нқ¬л§қн•ҳлҠ” мҲҳн—ҳмғқ л“ұ 18лӘ…мқҙ ліҙкұҙліөм§Җл¶Җ·көҗмңЎл¶Җ мһҘкҙҖмқ„ мғҒлҢҖлЎң лӮё мқҳлҢҖм •мӣҗ мҰқмӣҗ 집н–үм •м§Җ н•ӯкі мӢ¬ мӢ¬л¬ём—җм„ң мқҳлҢҖ лӘЁм§‘ м •мӣҗ мөңмў… мҠ№мқёмқ„ л©Ҳм¶ң кІғмқ„ мҡ”мІӯн–ҲлӢӨ. м•һм„ң м„ңмҡён–үм •лІ•мӣҗмқҖ 집н–үм •м§Җ мӢ мІӯмқ„ к°Ғн•ҳн•ң л°” мһҲлӢӨ. м§Ғм ‘м Ғ мқҙн•ҙ лӢ№мӮ¬мһҗк°Җ м•„лӢҲлһҖ мқҙмң м—җм„ңлӢӨ. л°ҳл©ҙ м„ңмҡёкі лІ•мқҖ н•ӯкі мӢ¬м—җм„ң мӣҗкі м ҒкІ©
лҢҖмӣ…мһ¬лӢЁ, AI BIGDATA кёҖлЎңлІҢ мһҘн•ҷмғқ м„ л°ңвҖҰкҫёмӨҖн•ң AI мҡ°мҲҳ мқёмһ¬ мңЎм„ұ
лҢҖмӣ…мһ¬лӢЁ(мқҙмӮ¬мһҘ мңӨмһ¬мҠ№)мқҖ мқёкіөм§ҖлҠҘкіј л№…лҚ°мқҙн„° 분야мқҳ кёҖлЎңлІҢ мқёмһ¬ мңЎм„ұмқ„ мң„н•ң 2024 AI BIGDATA кёҖлЎңлІҢ мһҘн•ҷмғқмқ„ м„ л°ңн–ҲлӢӨкі 30мқј л°қнҳ”лӢӨ. 2021л…„ м„ л°ңмқ„ мӢңмһ‘н•ң 'лҢҖмӣ…мһ¬лӢЁ AI BIGDATA кёҖлЎңлІҢ мһҘн•ҷмғқ'мқҖ мқёкіөм§ҖлҠҘкіј л№…лҚ°мқҙн„°к°Җ мӮ¬нҡҢ м „л°ҳм—җ к°Җм ёмҳ¬ ліҖнҷ”мҷҖ нҳҒмӢ мқ„ мқҙлҒҢ кёҖлЎңлІҢ мҡ°мҲҳ мқёмһ¬лҘј л°ңкөҙн•ҳкі м§ҖмҶҚ к°ҖлҠҘн•ң кІҪмҹҒ мҡ°мң„лҘј нҷ•ліҙн• мҲҳ мһҲлҸ„лЎқ м§Җмӣҗн•ҳлҠ” лҢҖмӣ…мһ¬лӢЁмқҳ лҢҖн‘ң мқёмһ¬ м–‘м„ұ мһҘн•ҷ н”„лЎңк·ёлһЁмқҙлӢӨ. лҢҖмӣ…мһ¬лӢЁмқҳ AI BIGDATA кёҖлЎңлІҢ мһҘн•ҷ н”„лЎңк·ёлһЁмқҖ н•ҷмғқл“Өмқҙ мӢӨл¬ҙ кІҪн—ҳмқ„ мІҙл“қн• мҲҳ мһҲм–ҙ мқёкё°к°Җ лҶ’лӢӨ. лҲ„м Ғм§ҖмӣҗмһҗлҠ” 1325
лҸҷм•„мҸҳмӢңмҳӨнҷҖл”©мҠӨ, к·ёлЈ№мӮ¬ лҢҖн‘ңл“Ө мӮ¬лӮҙ м№ҙнҺҳ мқјмқј л§ӨлӢҲм Җ ліҖмӢ
лҸҷм•„мҸҳмӢңмҳӨнҷҖл”©мҠӨ(лҢҖн‘ңмқҙмӮ¬ мӮ¬мһҘ м •мһ¬нӣҲ)лҠ” лҸҷм•„мҸҳмӢңмҳӨк·ёлЈ№ лҢҖн‘ңмқҙмӮ¬л“Өмқҙ мӮ¬лӮҙ м№ҙнҺҳ л””м—җмқҙмӣҗм—җм„ң мқјмқј л§ӨлӢҲм ҖлЎң лӮҳм„ңл©° мһ„м§Ғмӣҗкіј мҶҢнҶө мӢңк°„мқ„ к°ҖмЎҢлӢӨкі 30мқј л°қнҳ”лӢӨ. к·ёлЈ№мӮ¬ лҢҖн‘ң мқјмқј л§ӨлӢҲм ҖлҠ” лҰ¬лҚ”мҷҖ кө¬м„ұмӣҗ, к·ёлЈ№мӮ¬ мһ„м§Ғмӣҗк°„ кұ°лҰ¬лҘј мўҒнһҲкі мҶҢнҶө нҷңм„ұнҷ”лҘј мң„н•ҙ л§Ҳл Ён–ҲлӢӨ. мӮ¬лӮҙ м№ҙнҺҳ л””м—җмқҙмӣҗ(DA-1201)мқҖ м§ҖлӮң 2017л…„ л°”мҒҳ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м•„м№Ёмқ„ кұ°лҘҙлҠ” м§Ғмӣҗл“Өмқ„ мң„н•ҙ л§Ңл“ кіөк°„мқҙлӢӨ. м§Ғмӣҗл“ӨмқҖ м Җл ҙн•ң к°ҖкІ©м—җ м•„м№Ё мӢқмӮ¬лҠ” л¬јлЎ мқҢлЈҢлҸ„ мқҙмҡ© к°ҖлҠҘн•ҳлӢӨ. м№ҙнҺҳлӘ…мқё л””м—җмқҙмӣҗмқҖ лҸҷм•„мқҳ 'DA'мҷҖ м°ҪлҰҪкё°л…җмқјмқё '12мӣ”1мқј' мқҳлҜёлҘј лӢҙм•ҳлӢӨ. м§ҖлӮңлӢ¬ 26мқјл¶Җ
-
н…ҢлқјнҺҷмҠӨ, н”јл…ёл°”мқҙмҳӨмҷҖ м°Ём„ёлҢҖ ADC кё°мҲ к°ңл°ң кіөлҸҷм—°кө¬ мІҙкІ°
к·ёлһҳл””м–ёнҠёмқҳ л°”мқҙмҳӨ мһҗнҡҢмӮ¬мқё н…ҢлқјнҺҷмҠӨ(лҢҖн‘ңмқҙмӮ¬ мқҙкө¬)лҠ” м•”нҷҳмһҗлҘј мң„н•ң м°Ём„ёлҢҖ ADC кё°мҲ м—°кө¬ к°ңл°ңмқ„ мң„н•ҙ н•ӯмІҙ-м•Ҫл¬ј м ‘н•©мІҙ(Antibody-Drug Conjugate, мқҙн•ҳ ADC) м „л¬ё л°”мқҙмҳӨн…Қмқё н”јл…ёл°”мқҙмҳӨ(лҢҖн‘ңмқҙмӮ¬ м •л‘җмҳҒ)мҷҖ кіөлҸҷ м—°кө¬ кі„м•Ҫмқ„ мІҙкІ°н–ҲлӢӨкі 30мқј л°қ
-
м„ңмҡёмӢңм•Ҫ, м„ңмҡёмӢң мһҗлҰҪ мӨҖ비 м—¬м„ұмІӯл…„ 진н•ҷмһҗ м§Җмӣҗ
м„ңмҡёмӢңм•ҪмӮ¬нҡҢ(нҡҢмһҘ к¶ҢмҳҒнқ¬) м—¬м•ҪмӮ¬мң„мӣҗнҡҢ(л¶ҖнҡҢмһҘ мқҙмқҖкІҪ, мң„мӣҗмһҘ л°•мҳҒлҜё)лҠ” 30мқј м•„лҸҷліөм§ҖмӢңм„Ө л°Ҹ мң„нғҒк°Җм • л“ұм—җм„ң л§Ң 18м„ё мқҙнӣ„ ліҙнҳёк°Җ мў…лЈҢлҗҳм–ҙ мһҗлҰҪмқ„ мӢңмһ‘н•ҳлҠ” мһҗлҰҪмӨҖ비 м—¬м„ұ 진н•ҷмһҗмқҳ мһҗлҰҪмқ„ м§Җмӣҗн•ңлӢӨкі л°қнҳ”лӢӨ. м„ңмҡёмӢң мһҗлҰҪм§Җмӣҗм „лӢҙкё°кҙҖмқҳ 추мІңмқ„ л°ӣм•„ 25лӘ…мқҳ мһҗлҰҪмӨҖ비 1
-
л©Җмё м—җмҠӨн…ҢнӢұмҠӨ мҪ”лҰ¬м•„, көҝмңҢмҠӨнҶ м–ҙм—җ мһ„м§Ғмӣҗ кё°мҰқн’Ҳ м „лӢ¬
кёҖлЎңлІҢ м—җмҠӨн…ҢнӢұ кё°м—… л©Җмё м—җмҠӨн…ҢнӢұмҠӨ(лҢҖн‘ң мң мҲҳм—°, мқҙн•ҳ л©Җмё )лҠ” 4мӣ” 20мқј 'мһҘм• мқёмқҳ лӮ 'мқ„ кё°л…җн•ҙ мһ„м§Ғмӣҗл“Өмқҙ мӮ¬мҡ©н•ҳм§Җ м•ҠлҠ” л¬јн’Ҳмқ„ кё°мҰқн•ҳкі , мқҙлҘј нҷңмҡ©н•ҙ мһҘм• мқёл“Өмқҳ мһҗлҰҪмқ„ лҸ•лҠ” 'м»Ён”јлҚҳмҠӨ нҲ¬ 비(Confidence to be): м•„лҰ„лӢӨмҡҙ м¶ңк·јкёё лҸҷн–ү' мӮ¬лӮҙ мә нҺҳмқё
-
мң„лІ„мјҖм–ҙ-н•ңкөӯлЎңмҠҲ, л””м§Җн„ё мқҳм•Ҫн’Ҳ м•ҲлӮҙ м„ң비мҠӨ м¶ңмӢң
мң„лІ„мјҖм–ҙ(лҢҖн‘ң кі мҡ°к· ·мқҙмқҖмҶ”)лҠ” кёҖлЎңлІҢ м ңм•Ҫкё°м—… н•ңкөӯлЎңмҠҲмҷҖ нҷҳмһҗл“Өмқ„ мң„н•ң мқҳм•Ҫн’Ҳ м•ҲлӮҙ м„ң비мҠӨлҘј м„ұкіөм ҒмңјлЎң м¶ңмӢңн•ҳкі н…ҢмҠӨнҠёлҘј мҷ„лЈҢн–ҲлӢӨкі 30мқј л°қнҳ”лӢӨ. мң„лІ„мјҖм–ҙмҷҖ лЎңмҠҲлҠ” м§ҖлӮң 2022л…„ 12мӣ” мІ« кі„м•Ҫмқ„ мұ„кІ°н•ҳкі ліё н”„лЎңм қнҠёлҘј 진н–үн•ҳм—¬ м„ұкіөлҰ¬м—җ л§Ҳл¬ҙлҰ¬н•ҳкі 2
лӢ№мӢ мқҙ
мқҪмқҖ분야
мЈјмҡ”кё°м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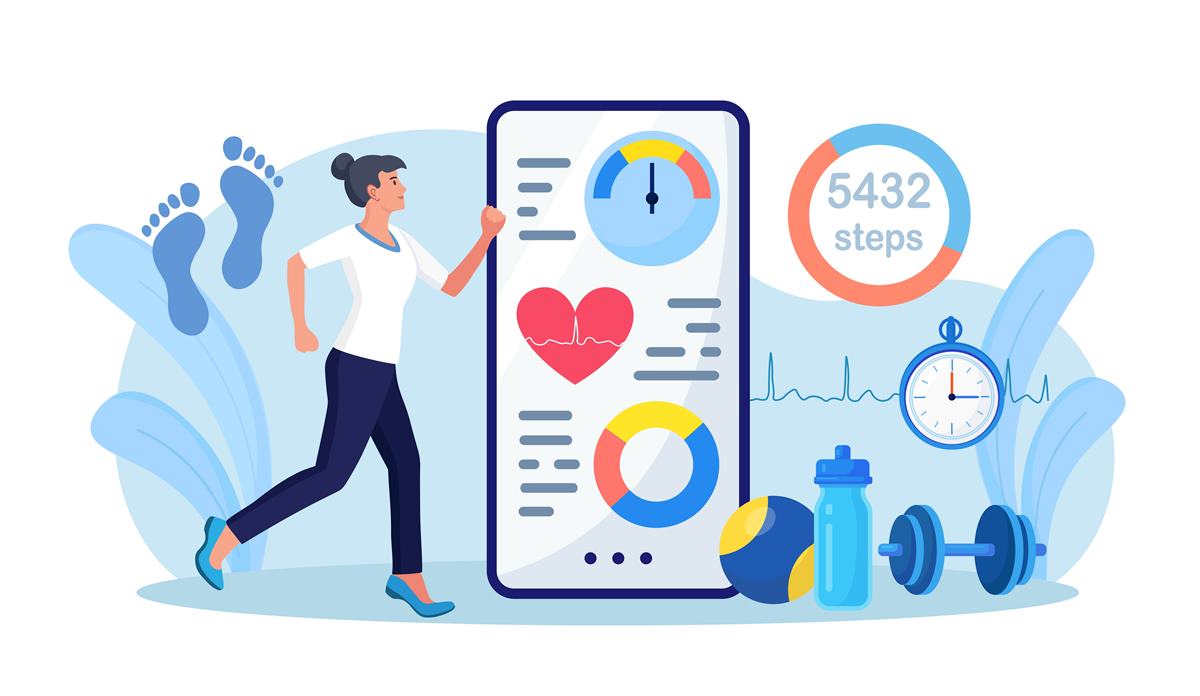







![[нҳ„мһҘ] м ҠмқҖ м—җл„Ҳм§ҖлЎң нҷңкё° м°ҫмқҖ 'лҢҖн•ңм•Ҫн•ҷнҡҢ м¶ҳкі„көӯм ңн•ҷмҲ лҢҖнҡҢ'](/upload/data/photo_direct/202404/20240419124353_ED11C.jpg)


лҸ…мһҗмқҳкІ¬
мһ‘м„ұмһҗ 비л°ҖлІҲнҳё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