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밀의료는 이미 전력질주를 시작했다. 한 방울의 혈액으로 암의 유전 정보를 추적하고, 치료 반응과 재발까지 예측하는 기술이 임상 문턱을 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변화가 '액체생검(liquid biopsy)',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ctDNA(순환종양 DNA)' 분석이다.
하지만 이 빠른 질주는 국내 의료 시스템의 현실과 맞물리는 순간 속도를 잃는다.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음에도 보험 적용은 여전히 닿지 않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환자 접근성을 가로막는다. 기술이 뛰고 있는 사이, 제도는 아직 준비 중인 것이다.
액체생검은 혈액이나 체액에서 종양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방식은 순환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 ctDNA) 분석이다.
ctDNA는 종양세포가 사멸하며 혈액으로 유출되는 유전자 조각으로, 이를 분석하면 조직 생검 없이도 종양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정밀의료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는 "ctDNA를 통해 영상 기반 평가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치료 전략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 전 항암요법 대상자나, 조직 생검이 어려운 뼈전이·고령·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액체생검의 활용도가 높다. 침습 부담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가능성에 비해, 임상 현실에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박 교수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급여다. 반복적으로 채혈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결국 비용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합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
현재 ctDNA 기반 액체생검은 대부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검사 1회당 150만~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대형병원의 일부 임상시험 또는 자가 부담이 가능한 일부 환자만 검사에 접근할 수 있다.
의료계는 액체생검이 단편적인 유전자 변이 확인을 넘어, 반복적인 모니터링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MRD(미세잔존질환) 기반 진단이 적용되는 대장암, 방광암, 유방암 등의 경우 치료 전후 반복 검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 검사비 이상의 사회적 비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MRD를 확인하려면 ctDNA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이는 결국 비용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치료제가 있어야만 임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예후가 나쁘다는 진단은 가능해도 정작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면 진단만으로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암종마다 유전적 특성이 다르고, 연구마다 변이 기준도 달라 아직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기술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검사 신뢰도와 적용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는 제도권 도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밀의료는 단순한 유전체 분석 기술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환자 진료에 적용할지를 결정짓는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환자 맞춤형 진단 기술이 임상 의사결정을 혁신하고 있음에도 검사 기준, 보험 체계, 치료제 연결 구조 등 시스템 전반의 정비 없이는 기술의 가치는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표준화가 이뤄져야 임상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 "현재 일부 암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ctDNA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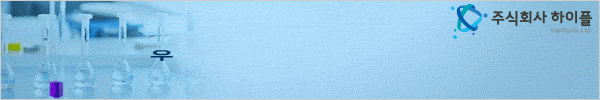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