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제약바이오기업 2024년 경영실적 분석 시리즈] ⑱ 잉여금 및 사내유보율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지난해 말까지 곳간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조원을 넘기며 '잉여금 보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유보율에서는 휴젤이 자본금 대비 2만%를 넘기는 수치를 기록했다.
4일 메디파나뉴스가 91개 상장 제약·바이오 업체 2024년도 사업보고서(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잉여금 및 유보율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보유한 총 잉여금은 약 35조9594억원으로 전년 33조6958억원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잉여금은 약 3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원 이상 늘어났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2조5925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며, 이에 따라 평균 유보율은 1387.1%로 전년(1212.7%) 대비 174.4%p 증가했다. 전체 91개사 중 유보율이 상승한 기업은 55개사, 감소한 기업은 26개사였고, 10개사는 결손 지속 또는 마이너스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2024년 말 기준 10조7497억원을 사내에 유보해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어 셀트리온이 3조7442억원, 유한양행이 2조10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1조7351억원, 휴젤 1조4650억원, GC녹십자 1조2116억원으로 조 단위 잉여금을 기록하며 톱6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한미약품 6809억원, 종근당 6714억원, 대웅제약 6357억원, 광동제약 5791억원, 동국제약 5582억원, 파마리서치 5376억원, 지씨셀 5246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었으며, 일성아이에스 4779억원, 보령 4666억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4651억원, SK바이오팜 4633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4241억원 등이 4000억원대 유보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율(잉여금/자본금) 기준으로는 휴젤이 자본금 66억원에 잉여금 1조4650억원을 보유하며 2만223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파마리서치는 자본금 52억원에 잉여금 5376억원을 보유하면서 유보율 1만230%를 기록했다. 이어 대한약품 9213.7%, 지씨셀 6640.4%, 삼성바이오로직스 6041.4%, 휴온스 5708.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5192.5%, 휴메딕스 4652.2%, SK바이오사이언스 4429.3%, 비씨월드제약 4300.7% 등이 4000% 이상의 유보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환인제약, 일성아이에스, 위더스제약, 삼아제약, 한독, 하나제약 등이 유보율 3000% 이상, 이연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신일제약, 알피바이오, 안국약품, 대봉엘에스, 대웅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제일약품, GC녹십자, 종근당, 중앙백신 등이 2000%대 유보율을 기록했다.
또한, 국전약품, 폴라리스AI파마, 옵투스제약,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대한뉴팜, 에스티팜, 팜젠사이언스, 경동제약, HK이노엔, 진양제약, 경남제약, 고려제약, 동화약품, SK바이오팜, 경보제약, 바이넥스, 한국파마, 광동제약, 보령, 메디포스트 등도 1000%대 유보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결손을 지속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바이오니아(결손금 505억원), 코오롱생명과학(결손금 2280억원), 비보존제약(결손금 2718억원), JW신약(결손금 383억원), 영진약품(결손금 16억원) 등은 전년 대비 결손을 이어갔다. 반면 국제약품은 전년 결손금 34억원에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유보율 25.5%를 기록했고, HLB제약도 결손금 311억원에서 잉여금 19억원으로 돌아서며 결손에서 벗어났다.
유보율은 기업의 설비확장 여력이나 재무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는 신규 투자로 인해 유보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경영전략에 따라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약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12년 약가 인하와 같은 대내외 정책 변화 이후부터는 보수적 자금운용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더해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국면에서도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업계의 유보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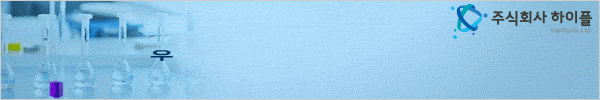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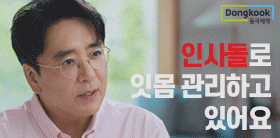


![[포토] 한림대성심병원, '로봇'은 카네이션을 싣고](/upload/editor/20250508140707_308D0.jpg)
![[포토]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upload/editor/20250508140139_F6A3D.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