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전립선암 PSMA PET/CT 검사 도입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PSMA PET/CT 검사를 도입했다. PSMA PET/CT 검사란 전립선암 또는 전이 암세포에서 보내는 방사선 신호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기기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하는 3차원 영상 검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상 검사에 활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영상 촬영 시 최신 방사성의약품인 F-18 PSMA-1007을 주사제로 활용한다. 해당 의약품은 기존 전립선암 PSMA PET/CT 검사에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던 다른 방사성의약품처럼 전립선암 세포막 항원(PSMA)에
현대약품, 에너지 음료시장 공략 확대‥'에너린' 캔 출시
현대약품이 NO SPIKE 에너지음료 에너린 250mL 캔 제품을 선보이며 몸에 부담스럽지 않은 NO SPIKE 에너지 음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6월 에너린 음료 150mL 병 제품을 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캔 제품을 추가로 출시함에 따라 에너지 음료 라인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에너린은 에너지음료를 섭취하면서도 고칼로리, 고카페인이 부담스럽거나, 각성 효과로 인해 숙면에 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 개발한 에너지음료다. 이번에 출시한 에너린 캔 제품은 설탕 대신 벌꿀이나 사
-
다이어트 주사로 살 빼면 담석 위험?…예방·치료 옵션 '우루사' 주목
최근 '살 빠지는 주사'로 알려진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즈-1) 계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체중 감량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에 따른 담석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
-
동국생명과학, 1Q 매출 350억·영업익 31억…실적개선 '뚜렷'
국내 최고 조영제 전문 기업 동국생명과학(대표이사 박재원)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50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전 부문에서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1분기 매출액 335억 원 대비 4.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8
-
학계, 뇌기능개선제 '기넥신' 치매 효과 조명…시장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SK케미칼 '기넥신'을 비롯한 '은행잎추출물(Ginkgo biloba)' 뇌기능개선제가 최근 신경과와 학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 치료영역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향후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
-
무너지는 의원급‥대개협 '환산지수 폐지·수가구조 개편'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단순 수치 인상이 아닌 수가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현행 협상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협상에서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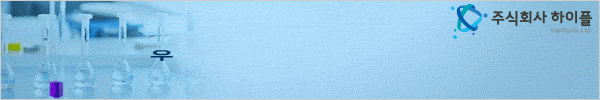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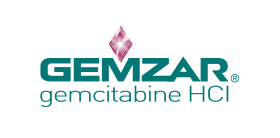


![[포토] 한림대성심병원, '로봇'은 카네이션을 싣고](/upload/editor/20250508140707_308D0.jpg)
![[포토]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upload/editor/20250508140139_F6A3D.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