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고대안산병원 서동훈 병원장 취임…"지역 특성화로 변화할 것"
고대안산병원은 12일 본관 지하 1층 로제타 홀 강당에서 서동훈 제21대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서동훈 병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방향 재설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선언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박명식 상임이사,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고려대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서 병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1970년생인 서 병원장은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관절 질환과 골반 및 대퇴부
일동제약, 올해 1분기 연결영업익 42억…젼년比 4274.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동제약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42억원으로 전년 영업이익 1억원 대비 427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60억원으로 전년 1510억원 대비 10%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9억원 대비 흑자전환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1340억원, 영업이익 61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이다.
-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식 개최
목암생명과학연구소(소장 신현진, 이하 목암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창립 4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신약개발의 산실로 오랜 명성을 유지해 온 목암연구소는 2022년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개발 연구소로 탈바꿈했다. 이후,
-
일동홀딩스, 올해 1분기 연결영업익 41억…젼년比 흑자전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동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41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38억원 대비 흑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98억원으로 전년 1619억원 대비 7.5%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
"2차병원도 중심축"‥선병원, 의료공백 속 성과 입증하며 제도 개선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포괄2차병원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집중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포괄2차병원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수가 구조,
-
의협 대의원회 "의대생 제적은 정치적 탄압‥교육부 즉각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생 제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 불참과 휴학계 제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부가 이를 징계와 탄압으로 되갚는 것은 헌법적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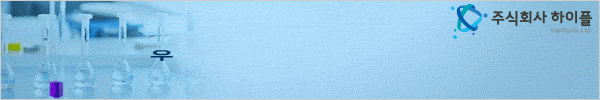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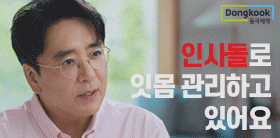


![[포토] 한림대성심병원, '로봇'은 카네이션을 싣고](/upload/editor/20250508140707_308D0.jpg)
![[포토]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upload/editor/20250508140139_F6A3D.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