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ЭілЯ∞ кЄ∞мВђ
мЦілХМмЪФ?
мЛ§мЛЬк∞Д
лє†л•ЄлЙімК§
к≤љкЄ∞лПДмХљ, к∞АнПЙмІАмЧ≠ мИШнХі нФЉнХі м£ЉлѓЉ ліЙмВђ лВШмДЬ
к≤љкЄ∞лПДмХљмВђнЪМ(нЪМмЮ• мЧ∞м†ЬлНХ)к∞А мІАлВЬ м£ЉлІР мІСм§СнШЄмЪ∞л°Ь лІЙлМАнХЬ нФЉнХіл•Љ мЮЕмЭА к≤љкЄ∞ к∞АнПЙмІАмЧ≠мЭД м∞ЊмХД мІАмЧ≠ м£ЉлѓЉк≥Љ мИШмЮђлѓЉлУ§мЭД мЬДл°ЬнХШк≥† нИђмХљ ліЙмВђ лУ± кµђнШЄнЩЬлПЩмЭД м†Дк∞ЬнЦИлЛ§. 22мЭЉ мХДмє®, к≤љкЄ∞лПД мЭШл£МліЙмВђлЛ®(мЭШмВђнЪМ, нХЬмЭШмВђнЪМ, мєШк≥ЉмЭШмВђнЪМ, к∞ДнШЄмВђнЪМ)к≥Љ к≤љкЄ∞лПДмЭШл£МмЫР нХ©лПЩ ліЙмВђнМАмЭШ мЭЉмЫРмЬЉл°Ь к∞АнПЙкµ∞ м°∞мҐЕл©і л≥ік±імІАмЖМмЧР ліЙмВђмЇ†нФДл•Љ мД§мєШнХШк≥† л≥Єк≤©м†БмЬЉл°Ь мІАмЧ≠ м£ЉлѓЉлУ§мЭШ к±ік∞ХмЭД л≥імВінФЉлКФ лУ± кµђмКђлХА ліЙмВђл•Љ мІДнЦЙнЦИлЛ§. мЭілВ† мЧ∞м†ЬлНХ нЪМмЮ•мЭА "мЮРмЧ∞мЮђнХіл°Ь мВґмЭШ нД∞м†ДмЭД мЮГмЭА мЭімЮђлѓЉлУ§кїШ кєКмЭА мЬДл°ЬмЭШ лІРмФАмЭД м†ДнХЬлЛ§"л©імДЬ "мЦілЦ†нХЬ к≤љмЪ∞мЧРлПД к±ік∞ХмЭА мЮГмІА мХКмХДмХЉ нХЬлЛ§. л™®лСРк∞А лВШмДЬ
мИШнХі нФЉнХі мІАмЧ≠ м∞ЊмЭА 'кЄікЄЙмЮђлВЬмХљкµ≠'
лМАнХЬмХљмВђнЪМ(нЪМмЮ• кґМмШБнЭђ)к∞А 22мЭЉ мІСм§СнШЄмЪ∞л°Ь нФЉнХіл•Љ мЮЕмЭА мІАмЧ≠мЧР 'лМАнХЬмХљмВђнЪМ кЄікЄЙмЮђлВЬкµђнШЄлЛ®(лЛ®мЮ• мЬ†мД±нШЄ·мЭімЭАк≤љ, мЭінХШ кµђнШЄлЛ®)'мЭД нММк≤ђнХШк≥† 'кЄікЄЙмЮђлВЬмХљкµ≠ мЪімШБмЭД к∞ЬмЛЬнЦИлЛ§. кЄікЄЙмЮђлВЬмХљкµ≠мЭА мВ∞мЧФм≤≠л≥µмІАкіА, мВ∞м≤≠м§СнХЩкµР, мГЭлєДлЯЙміИлУ±нХЩкµР лУ± м£ЉмЪФ лМАнФЉмЖМл•Љ м§СмЛђмЬЉл°Ь мЭілПЩнХШл©∞ мЪімШБлРШк≥† мЮИлЛ§. мИШнХіл≥µкµђк∞А нХЬм∞љ мІДнЦЙ м§СмЭЄ мВђлМАлІИмЭДнЪМкіА лМАнФЉмЖМмЧРлПД к∞РкЄ∞мХљ·мІДнЖµм†Ь·мХИм†ХмХ°·нММмК§ лУ± мЭШмХљнТИк≥Љ лУЬлІБнБђл•Љ к≥µкЄЙнХШл©∞ мЭімЮђлѓЉк≥Љ мЮРмЫРліЙмВђмЮРлУ§мЭШ к±ік∞Х нЪМл≥µмЭД мІАмЫРнХШк≥† мЮИлЛ§. кґМмШБнЭђ лМАнХЬмХљмВђнЪМмЮ•мЭА "мИШнХіл°Ь к≥†нЖµл∞Ык≥† мЮИлКФ мЭімЮђ
мДЬмЪЄмЛЬмХљ, лЛєлЗ®мЖМл™®мД±мЮђл£М м≤≠кµђ к∞ДнОЄнЩФ мІАмЫРвА¶мХљкµ≠ к≤љмШБ лЛ§к∞БнЩФ
мДЬмЪЄмЛЬмХљмВђнЪМ(нЪМмЮ• кєАмЬДнХЩ)лКФ 22мЭЉ л©ФлФФмЭЄнПімК§(лМАнСЬ мЮДл™ЕмЮђ мХљмВђ)мЩА лЛєлЗ®мЖМл™®мД±мЮђл£М м≤≠кµђмЧЕлђі мІАмЫРмЭД мЬДнХЬ мЧЕлђінШС놕 мЦСнХік∞БмДЬ(MOU)л•Љ м≤ік≤∞нХШк≥†, 'лЛєлЗ®мЖМл™®мД±мЮђл£М м≤≠кµђ к∞ДнОЄнЩФ мІАмЫРмВђмЧЕ'мЭД л≥Єк≤©м†БмЬЉл°Ь мЛЬмЮСнЦИлЛ§. мЭіл≤И мВђмЧЕмЭА мХљкµ≠мЬДмЫРнЪМ(лґАнЪМмЮ• мЬДмД±мЬ§, мЬДмЫРмЮ• мЭік≤љл≥і⋅мЛ†мКємЪ∞)мЩА мХљкµ≠к≤љмШБмІАмЫРл≥ЄлґА(л≥ЄлґАмЮ• мЬ†мШ•нХШ)к∞А м£ЉкіАнХШл©∞, м≤≠кµђ м†Им∞®мЭШ нЪ®мЬ®нЩФмЩА мХљкµ≠мЭШ к≤љмЯБ놕 к∞ХнЩФл•Љ л™©нСЬл°Ь мґФмІДнХЬлЛ§. мДЬмЪЄмЛЬмХљмЭА кЈЄлПЩмХИ м≤Шл∞©м°∞м†ЬмЧР мІСм§СлРЬ мХљкµ≠мЭШ мИШмЭµ кµђм°∞л•Љ лЛ§л≥АнЩФнХ† л∞©мХИмЭД л™®мГЙнХі мЩФмЬЉл©∞, кЈЄ м≤Ђк±ЄмЭМмЬЉл°Ь лЛєлЗ®мЖМл™®мД±мЮђл£М м≤≠кµђ мЧЕлђіл•Љ к∞ЬмД†нХі нЪМмЫРмЭШ лґИнОЄмЭД нХі
-
[нПђнЖ†] м†ХмЭАк≤љ м†Ь56лМА л≥ік±іл≥µмІАлґА мЮ•кіА мЈ®мЮД
-
мШµлФФл≥і нЧИк∞А 10м£ЉлЕДвА¶нХ≠мХФ мєШл£М кЄ∞л≥Є л≤†мЭімК§ мЮРл¶ђлІ§кєА
[л©ФлФФнММлВШлЙімК§ = м°∞нХімІД кЄ∞мЮР] л©імЧ≠кіАлђЄмЦµм†Ьм†Ь 'мШµлФФл≥і(лЛИл≥Љл£®лІЩ)'к∞А кµ≠лВі нЧИк∞А 10м£ЉлЕДмЭД лІЮмЭінХЬ к∞АмЪілН∞, мШµлФФл≥імЩА 'мЧђл≥імЭі(мЭінХДл¶ђлђілІЩ)' л≥СмЪ©мЪФл≤ХмЭі мІАлВЬ 10мЭЉлґАнД∞ м†Им†Ь лґИк∞АлК•нХЬ лШРлКФ м†ДмЭімД± к∞ДмДЄнПђмХФмЭШ 1м∞® мєШл£Мм†Ьл°Ь м†БмЭСм¶ЭмЭД нЩХлМАнХШл©імДЬ нХ≠мХФ мєШл£М кЄ∞л≥Є л≤†мЭімК§л°Ь мЮРл¶ђлІ§
-
лґАкіСмХљнТИ, мШђнХі 2Q лЛєкЄ∞мИЬмЭµ 64мЦµвА¶15лґДкЄ∞ лІМмЧР нЭСмЮРм†ДнЩШ
лґАкіСмХљнТИмЭі мШђнХі 2лґДкЄ∞ лЛєкЄ∞мИЬмЭімЭµмЭі 15лґДкЄ∞ лІМмЧР нЭСмЮРл°Ь м†ДнЩШлРРлЛ§к≥† 22мЭЉ л∞ЭнШФлЛ§. лґАкіСмХљнТИмЭА мЭілВ† мШђнХі 2лґДкЄ∞ мЧ∞к≤∞кЄ∞м§А лЛєкЄ∞мИЬмЭімЭµмЭі 64мЦµмЫРмЭД кЄ∞л°ЭнЦИлЛ§к≥† к≥µмЛЬнЦИлЛ§. мЭілКФ 3лЕД 9к∞ЬмЫФ лІМмЧР нЭСмЮРм†ДнЩШмЭД лЛђмД±нХЬ к≤ГмЭілЛ§. мШђнХі 2лґДкЄ∞ мЧ∞к≤∞кЄ∞м§А лІ§мґЬмХ°к≥Љ мШБмЧЕмЭімЭµмЭА 426мЦµмЫР,
-
кµ≠л¶љмХФмДЉнД∞¬ЈмДЬмЪЄлМА, мШ§к∞АлЕЄмЭілУЬ кЄ∞л∞Ш кµђк∞ХмХФ жЦ∞лґДл•Шм≤ік≥Д к∞Ьл∞Ь
кµ≠л¶љмХФмДЉнД∞(мЫРмЮ• мЦСнХЬкіС)мЩА мДЬмЪЄлМАнХЩкµР к≥µлПЩмЧ∞кµђнМАмЭі нЩШмЮР мЬ†лЮШ кµђк∞ХмХФ мДЄнПђл•Љ мЛ§нЧШмЛ§мЧРмДЬ л∞∞мЦСнХЬ 'лѓЄлЛИ мЮ•кЄ∞(мШ§к∞АлЕЄмЭілУЬ)'л•Љ нЩЬмЪ©нХі кµђк∞ХмХФмЭД нШХнГЬнХЩм†БмЬЉл°Ь мГИл°≠к≤М лґДл•ШнХШлКФ кЄ∞мИ†мЭД к∞Ьл∞ЬнЦИлЛ§к≥† л∞ЭнШФлЛ§. к≥µлПЩ мЧ∞кµђнМАмЭА кµ≠л¶љмХФмДЉнД∞ кєАмЬ§нЭђ кµРмИШ(лґДмЮРмШБмГБмЧ∞кµђк≥Љ), мµЬмД±мЫР кµРмИШ(нЭђкЈАмХФмДЉ
лЛємЛ†мЭі
мЭљмЭАлґДмХЉ
м£ЉмЪФкЄ∞мВђ
 мєімєімШ§м±ДлДРмґФк∞А
мєімєімШ§м±ДлДРмґФ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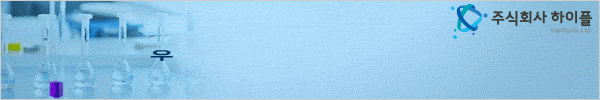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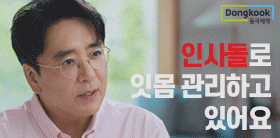


![[нПђнЖ†] м†ХмЭАк≤љ м†Ь56лМА л≥ік±іл≥µмІАлґА мЮ•кіА мЈ®мЮД](/upload/editor/20250722185456_8B040.jpg)
![[нПђнЖ†] мЭЄнХШлМАл≥СмЫР, 'л™ЕнЩФл°Ь л≥ілКФ мЛђлЗМнШИкіАмІИнЩШ'](/upload/editor/20250717112617_615BC.png)

лПЕмЮРмЭШк≤ђ
мЮСмД±мЮР лєДл∞Ал≤ИнШЄ
0/200